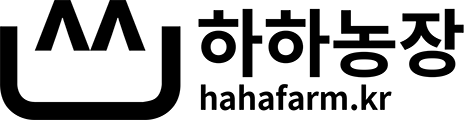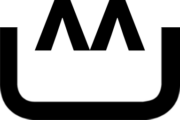다음날, 뜨롱페디에서 뜨롱라를 넘어 묵티나스라는 마을까지 가는 것이 그 날의 일정이었다. 워낙 고도가 높고 지세가 험해서 그 중간에서 자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이캠프’라고 하는 뜨롱페디 바로 윗마을 뿐이었다. 세바스찬과 앨리스가 고생한 그 마을. 그래서 그 길고 험한 길을 하루에 가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부터 (3~5시 사이) 가기 시작했고 나는 ‘뭘,, 그런걸가지고..’ 하며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조금 느긋하게 먹고 7시가 다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중 제일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뜨롱페디에서 하이캠프까지의 길은 매우 가파른 경사길에 눈까지 쌓여있어서 ‘험한길’ 그 자체였다. 당연히 그 전보다 숨이 찬건 사실. 티베트에서 5200m 고개길을 무거운 자전거로 끌고올라가던 일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그 때의 무거운 자전거가 없었으므로 수월했지만,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고 숨이 너무너무 찼다. 숨을 크게 쉬어가며 한발 한발 옮겨갔다.
해는 머리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햇빛에 비친 눈들이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선글라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 눈이 부시어 도저히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 그리고 하늘빛은 티베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짙은 파랑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일찍 힘이든 사람들을 실어다 날랐던 말과 마부가 여럿 내려왔다.
“힘들면 말 타고가도 되요~”
“아니요, 우린 아직 멀쩡해요~”




힘겹게, 너무나 힘겹게 올랐다. 도중에 있던 찻집에서 생강차를 겨우 마신 것 이외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4시간이라는 ‘장대한’시간이 지나서야 뜨롱라에 도착했다.
“아… 뜨..롱..라…다…”
“그..래.. 여기가.. 뜨롱..라…”
나방이 날아갈 때 흘리는 목소리로 서로 뜨롱라에 도착한 것을 두고 축하하고 위로했다. 그곳엔 찻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울렁거리고, 꿈속을 헤메는 것 같았다.
“야. 그래도 기념사진은 찍어야 되지 않겠나?”
‘성공을 축하합니다.’ 라는 입간판 옆에서 기념사진을 겨우 찍었다. 그곳에는 당황스러운 글귀가 있었는데 바로 ‘See you again”. 다시보자는 말이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다시보자니!! 찻집 안에서 죽을 것만 같은 몸을 앉혀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여자와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단번에 봐도 세바스찬과 앨리스였다. 숙소엔 우리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마지막인 것 같았다. 세바스찬이 우리를 발견하고 찻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숙인채, 우리쪽으로는 눈길한번 주지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다.
“앨리스가.. 많이.. 힘..든..가봐… 먼저..갈게.. 묵티..나스에서.. 봐..”
그들은 정말로 힘든 눈치였다. 기념사진도 찍지않고 그곳을 통과했으니, 우리보다는 힘들어 보였다. 한참을 현실같은 꿈속에서 헤메다가 오르는 길과는 판이하게 다른 완만한 길을 내려갔다. 한국의 낮은 산(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을 오르내릴 때도 아프던 무릎이었는데 그 높은 산을 오르고 이제야 내려가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높은 위치 때문인지 시야는 탁 트여 아주 먼 곳까지 볼 수 있었다.
그 광대한 풍경속으로 그만 날아갈 것도 같았다. 세바스찬과 앨리스도 먼저 갔으니 가장 마지막 여행자임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부끄럼 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내려갔다. 산에서 소리를 내면 주변 생물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엔 땅과 눈, 바람과 하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나의 노랫소리쯤은 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상관없었다.
왜 사람들이 새벽부터 출발했는지, 해가 다 넘어가도록 목표마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 고개주변으로는 정말 황무지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다. 더 늦기 전에 발을 재촉하여 신속히 내려갔다. 다행히 어둡기 전에 도착했다. ‘묵티나스’ 산행 중에 묵었던 숙소 중 최고가 그곳에 있었다. 그곳엔 다른 숙소도 많았지만 세바스찬과 앨리스도 그곳에 묵고 있었다. 앨리스는 뜨롱라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웃으며 우리를 반겼다.
“그 때는 세상이 뒤집혀 있었다니까”
서로서로 그 말에 동감하며 큰바탕으로 웃고는 함께 식사를 했다. 산행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도 그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 티베트와 네팔에서 주로 취급되는 야크의 고기였다. 일반 소와는 분명 틀린 맛이 베어있었으나 미식가가 아닌이상 언어로써 구분해낼 수 없었다. 일본의 ‘코타츠’처럼 식당의 탁자 아래에 나무를 태워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는데 그 포근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일반인에겐 나름대로 힘들었던 산행이었던지라, 산행 중 자주 마주쳤던 – 그곳은 출발일자가 비슷하면 거의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었다 – 사람들과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으며 무사산행을 축하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가지 비밀을 한 여행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일찍 출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해가 뜬 이후 계곡아래에서부터 강한 기류가 올라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개 정상에는 눈보라와 돌풍이 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뜨기전에 고개를 통과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상을 통과했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은 나간 사람인 것이다. 다행히 그 때의 기류가 안정되어 있었던 탓에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주 고생했거나 땅에 묻히는 결과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