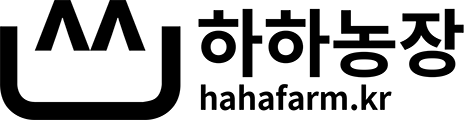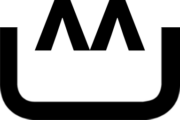네팔에 온 이유중의 하나가 히말라야산맥 산행 때문이다. 카트만두 주변에도 여러가지 산행경로가 있고 하루산행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좀 더 흥미롭고 멋진 산행을 하고 싶었다. 네팔에서 할 수 있는 산행으로는 초모랑마(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산행,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산행, 랑탕 산행, 힐람부 산행, 안나푸르나 환상(環狀)산행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배낭여행자들에게 유명한 것이 초모랑마 베이스캠프 산행과 안나푸르나 환상산행이었다.
티벳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초모랑마 베이스캠프를 건너뛰었었다. 그래서 초모랑마 베이스캠프를 갈까 생각해보았는데 산행지도를 보니 그저 먼 곳에서부터 그곳까지 걸어들어갔다가 다시 되짚어나오는 경로였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유명 산행경로인 안나푸르나 환상산행의 지도를 보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맥을 완전히 한바퀴 도는 경로였다. 한국에서도 산행할 때는 오른길로는 다시 안내려오는 특이한 습성? 아니 그렇게 하기싫어서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도 오른길로 다시 내려오는 초모랑마 베이스캠프 경로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거리엔 안나푸르나 산의 거대한 모습들이 조그만 엽서에 담겨져 많이 팔고 있었는데, 이런 산들이 정말 네팔에 있을까 할 정도로 거짓말같은 멋진사진들이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결국엔 안나푸르나 환상산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산행의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 있는 네팔 제 2의 도시 포카라로 이동하기로 했다.
안나푸르나 환상 산행은 보름이상 대단히 길게 산행을 해야한다. 그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지않고 짐꾼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길이 멀고 험해서 산행 안내원도 대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수의 인원만 갈 때는 산행 안내원이 짐꾼 역할을 병행할 때도 있다.
나는 카트만두에서 만난 친구 승진이와 나 이렇게 두명이었고 특별히 짐꾼이나 안내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행안내책자에 ‘필요없다’고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산행 거리가 안되는 곳에 항상 숙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기에 굳이 야영도구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짐도 별로 무겁지 않게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보통은 카트만두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하여 안내원과 짐꾼을 고용하여 가거나 아니면 단체여행을 신청하여 이동하는데, 우린 젊으니까 일단은 포카라시로 이동하여 부딪혀 보자고 간 것이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시로 이동은 지역버스를 이용했다. 버스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투어리스트 버스’와 네팔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로컬 버스’가 있는데, ‘투어리스트 버스’의 존재를 알지못한채 달달거리는 ‘로컬’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했다. 버스는 ‘TATA’라는 인도제 중형버스였고 좌석은 불편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가는 중에 ‘펑’ 소리와 함께 펑크가 나고 정비소에 잠시 잠시 정차하여 차량을 정비하기가 일쑤였다. 결국엔 180km의 거리를 무려 8시간을 소요하여 도착했다. 하지만 날씨가 흐려 흔히 거리의 엽서에 나와있던대로 히말라야 산맥이 훤히 보이지 않아 약간은 실망을 했고, 또 언젠가 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레이크 사이드’로 불리는 호수가 마을은 완전한 관광마을로 발전해 있었는데 조용한 마을분위기와 맑은 공기로 카트만두 타멜에서 얻은 공해때가 한번에 씻기는 것 같았다. ‘디파와리’라는 축제기간이라 집집마다 단 이쁜 등과 촛불들은 이국의 신비한 정취에 취하도록 충분했다. 또,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여행의 묘미를 한껏 드높여 주었다.




하지만 포카라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페와 호수’였다. 각종 호텔이나 식당,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레이크 사이드.’(바이담), 그 레이크가 페와호수이다.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얼핏 호수가 보였다. 대충 예상은 했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보였다. 카트만두는 물론이고 도착한 포카라시의 상점에는 페와호수에서 찍은 안나푸르나 산맥 사진이 대량으로 깔려 있었다. 안나푸르나 산은 잔잔한 호수에 비친 것이 하나, 그대로 눈에 보인 것이 하나 해서 두 개였다. 반사된 안나푸르나가 너무나 선명하여 입을 다물지를 못했는데, 그 사진이 이 호수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런 사진을 찍고 싶었다. 만년설이 태양에 빛나 물속까지 스며든 그런 풍경을. 아침일찍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여행자 신분에서 전날의 밤을 그냥 보내지 못해 술을 과하게 먹었던게 화근이었던지 아침 8시가 지나서야 깨어날 수 있었다. 씻으려 화장실을 갔는데 창밖으로 뾰족하게 솟아난 ‘타르푸 출리’(흔히 텐트피크라고 부른다)가 보였다. 씻어야 된다는 것은 깜빡하고 승진이 보고 소리치며 빨리 나가자고 했다.
호텔 밖 길 위에서도 타르푸 출리는 줄 곧 보이며, 처음보는 설산은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다. 입을 벌리고 멍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다. 눈 앞에 설산이 펼쳐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호수에 담겨진 안나푸르나를 찍기 위해 선착장으로 가서는 소형배를 빌렸다. 몇시간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가격은 불과 300루피밖에 안됐다. 승진이와 내가 노를 하나씩 잡고는 뱃머리가 호수가 중앙을 향하게 해놓곤 힘차게 저으며 나아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봉우리 주변에는 구름들이 피어올랐다. 이러다가는 상상했던 사진을 얻지 못할 것 같아 재촉해서 노를 저었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잘 되지 않았다. 태양은 머리위로 점점 다가왔고 구름은 더욱 더 높이 피어올랐다. 결국 호수 끝까지 닿았지만 원하던 사진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너무나 고요한 수면위로 맞은편에 위치한 높지 않은 산이 그대로 비쳐졌다.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던 우리의 보트가 멈춘지 조금 지나니 호수는 말그대로 유리판같이 평평하고 얌전해졌다.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은 자연산 ‘데칼코마니’였다. 초록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이 수면위로 그대로 비쳐져 신기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사진을 몇 장 찍긴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쳐다보기만 했다.
숙소에 돌아와서 바깥 의자에 앉아있었다. 숙소의 람 아저씨는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페와 호수에서 노젓는 배 탔어요. 정말 멋지던데요”
말을 끝내고 사진기에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다소 익숙한 풍경인지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호수에 떠 있는 작은 섬 위로 있는 사원이 무슨 사원인지 물어보았다.
“바라히 사원이에요. 시와신(시바신)과 관련된 것이고, 그곳에 왜 호수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 곳이지요”
때마침 승진이가 돌아와 이야기가 끊어졌다. 후에 사전을 찾아보니 그곳 페와호수와 바라히 사원에 관련된 전설이 있었다.
시와신이 거지로 분장하여 포카라로 왔다. 여러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쫓고 말았다. 그러나 노부부가 사는 한 집에서 따뜻하게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시와신은 그들에게 큰 재앙이 곧 닥칠테니 당장 피하라고 말했다. 당황한 노부부는 그의 말을 듣고 황급히 언덕으로 도망쳤다. 도망치기 무섭게 마을은 물바다가 되었고 마을사람들은 모두 생사를 달리했다. 노부부는 그가 시와신임을 깨닫고 호수에 떠있는 섬에다 그를 받드는 사원을 세웠다. 그것이 바라히 사원.
그 호수엔 전설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서려있는 것이다. 파괴신 시와가 식사대접을 거절했다고 마을사람들을 몰살을 한 것이다. 역시 파괴신 답다. 외모를 따지지 말고 누구든 도와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암…
페와 호수 이외에 평화의 탑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보기도 하면서 산행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특히 포카라에서 보이는 신비하고도 거대한 안나푸르나 산맥은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장비야 뭐, 입을 옷만 있으면 됐기에 특별한 준비는 없었다.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