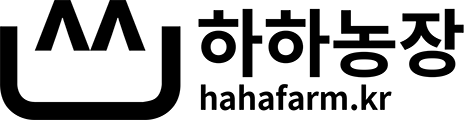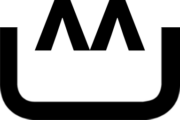‘니얄람’의 고도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와 비슷한 3700m 가량이었다. 그렇기에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왔지만 그곳까지도 황량함이 묻어있었다. 출발해야할 그 다음날엔 비 때문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했다. 아마도 그곳은 골깊은 계곡이었고, 인도, 네팔 방면에서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인 것 같았다.
다음날도 역시 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지체할 수는 없었다. 방수옷으로 무장을 한 뒤 출발했다. 길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올라가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모퉁이를 돌았을 때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마주보이는 산의 왼편 사면과 오른편 사면의 식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황무지, 오른쪽은 푸른숲이 시작되었다.
그 곳으로부터 조금씩 내려가면 갈수록 나무는 점점 빽빽해지고 개체수도 듬뿍듬뿍 늘어났다. 처음에는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다가 얼마안되어 활엽수림으로 대체되었다. 또, 산 곳곳에서 물이 쏟아져내려 만들어진 가파른 계곡은 장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한눈에 다섯 개가 넘는 폭포가 보인 것도 그 때가 처음이었고, 그 후로도 없을 것 같았다.




안개가 온몸을 적시며 짙게 드리웠다 걷혔다를 반복했다. 한증탕에서 한참을 땀을 빼다 더위를 참지못하고 온몸에 물을 뿌리는 ‘스콜샤워기’로 달려가 촤~하는 샤워를 하고나면 그 상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안개들은 계속해서 그런 상쾌함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숲이 주는 상쾌함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청량한 공기는 전신에 찌릿찌릿함도 흐르도록 만들었다.
공기량도 풍부해져서 고지에서의 나른했던 기분은 완전 사라졌고 어깻죽지에서 날개가 튀어나와 훨훨 날아갈 것 같기도 했다. 황량한 티베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짙은 숲을 보니 다른행성에라도 온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나는 차량도 극히 소수여서 마음껏 그 길을 즐길 수 있었다.











소리치고 노래하며 웃어도보고 괴성도 지르며 온갖 해괴한 짓은 다했다. 이유야 당연히 너무나 기쁘고, 감동스러웠기 때문이다. 가다가 멈추어 서서 분위기에 젖으며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른 횟수도 말도 못할만큼 많았다. 하루만에 트럭을 타고 높은 고개를 넘어왔지만 ‘이게 자전거 여행이라고!!’ 소리치며 자뻑에 빠지기도 했다.
수십킬로에 달하는 그 길을 넘어 겨우 도착한 국경마을 숙소에서 이 길을 ‘감동’이라는 말을 빼면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해 보았다. 생쑈를 하느라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엔 ‘너무나 감동’, ‘무지 감동’, ‘지나치게 감동’.. 뭐 그런말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황홀하다, 무아지경이다 등등의 단어들은 감동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다. 예를들면, 풍경에 감동받아 황홀경에 이르렀다든지, 감동의 수치가 지나쳐 무아지경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이 때 뉘우치게 된 것인즉, 감동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평소에 아무렇게나 뱉은 ‘감동’이라는 말 때문에 이러한 기막히고도 유일무이하고 황홀경에 빠뜨렸다가 무아지경까지 이르게하는 풍경을 봤을 때 감동이라는 말을 하기엔 황량한 절벽에서 외치는 메마른 메아리 같기 때문이다. (고동(考動)(생각이 움직인다.)나 심동(心動)(마음이 움직인다) 같은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아!! 이거 완전 고동인데!!” -.-;;)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