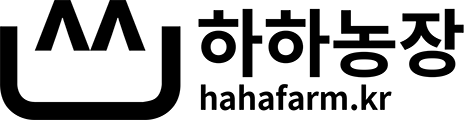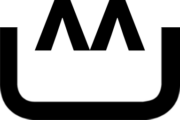그토록 바랐던 포탈라궁 앞에 섰지만, 곧 슬픔이 닥쳤다.
궁 앞의 광장, 오성홍기와 공산당 혁명탑.
우리 일제강점기가 생각나서 힘들었다.

라싸에 도착한 후 좀 더 쉬어줘야 함에도 도착신고차 몇걸음 옆에 있는 포탈라궁을 구경하러 나섰다. 역시나 고산지역답게 하늘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며 파란하늘이라기보다 보라하늘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새파란 하늘이었다. 또한 그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들은 순백에 가까운 색이라 너무나 눈부셔 제대로 쳐다보기도 힘든 정도였다.
오래전부터 티베트 여행을 꿈꾸어 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신비의 나라로 생각했었다. 가끔씩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던 신비한 포탈라 궁의 모습. 브레드 피트가 출연한 ‘티벳에서의 7년’ 영화를 보고난 후에는 티베트는 완전 나의 가슴속에 파고들었었다.
그 포탈라 궁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계단식 형태로 올라가는 건물의 웅장한 모습. 신비한 백색과 적색 벽. 구름들은 포탈라 궁 옥상에 걸린 듯 멈추어 서 있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 건물 자체도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상상 속에서 있던 것이 현실 속으로 나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포탈라 궁 맞은편 포탈라 광장을 보고나서는 그 감동이 슬픔으로 바뀌어 버렸다. 깃대가 높은 중국 오성기가 푸덕이고 광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높은 탑과 노동을 상징하는 동상으로 보이는 공산혁명 기념물이 들어서 있었다.
중국입장에서나 그것이 기념할만 한 것이지, 티베트 입장에서는 우리의 경복궁 내에 지어진 ‘조선총독부’와 같은 민족의 정기를 끊는 몹쓸 건물일 것이다. 2006년 7월에 개통한 베이징 – 라싸 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는 라싸에 가기쉬워서 좋겠구나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본 강점기때 부산 – 신의주간 철도 개통때처럼 좀 더 강력한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거라고 하니 가슴이 찢어졌다.
철도가 개통된 이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의 독립은 힘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내가 봐도 티베트는 점점 더 중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철로를 통해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돈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티베트를 다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 뻔하다. 그들은 티베트의 상권을 쥐어 잡을 것이고, 티베트인들은 더욱 더 가난해 질 것이다.

라싸풍경은 티베트라는 다른 나라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중국의 특별한 도시에 왔다는 느낌을 더 받았다. 티베트어가 조그맣게 표시된 것을 제외한다면 다들 한자로 된 간판이었기 때문이었고, 도로를 메우고 있는 차량들, 릭샤들, 혼잡한 교통상황도 그런 느낌을 받도록 했다.
처음으로 들어간 티베트 식당에서는 중국에서처럼 메뉴판을 툭 하며 던져놓고 쳐다보기만 했다. 미리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는 얘길 들었던 터라, ‘I’m not chinese’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타시데레'(안녕하세요)라고 덧붙여 말하니 그 직원의 기분이 배로 좋아지는 듯 했다.
우리나라도 뼈아픈 현실이 있었기에 티베트의 지금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 중국의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의 언론을 통제하고 또, 강대국의 간섭까지도 통제하여 티베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믿기질 않았다. 티베트의 통치자 ‘달라이 라마’는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도, 한국이 중국의 눈치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던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읽었었다. 그 책에 보면 티베트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또 그로부터 배우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민족이라 중국이 쳐들어 왔을 때 크게 힘써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나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나라 구경하듯이 하고, 티베트 사람들 보고도 중국어로 얘기했다. 포탈라 궁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하러 들어갔다. 티베트 왕(달라이 라마)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침략국가의 민족이 티베트의 궁을 관광하러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다.
중국이 어떻게 과거 일본만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홍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루였다. 머리위의 푸른하늘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차갑고 슬프게 느껴졌다.
<달려라 자전거>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32일동안 유라시아를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그 때 당시에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